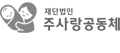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호출산제 1년… 아이 낳을 용기뿐 아니라 키울 용기도 줬다

게티이미지뱅크
# 박서연(가명·23)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박씨는 보호출산을 택했다. 그는 아이에게 "크면 연락해 달라"는 편지를 썼다. 또 나중에 성인이 된 아이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했다. 박씨는 "당장은 처지가 불안정해 키울 수 없었지만, 자리를 잡으면 보육원에서 데려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작년 7월 19일 도입 후 100명 넘는 여성이 보호출산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유기 건수가 줄어드는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효과도 확인됐다. 위기 임신부들은 보호출산제 상담 과정에서 지원 제도를 알게 되고, 숙려 기회를 가지면서 오히려 키울 용기를 얻었다고도 말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도 없이 숨지거나 유기되는 갓난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로 위기 임신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시행됐다.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신부는 가명(관리번호 부여)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위기임신부 심층상담자 최종 결정. 그래픽=이지원 기자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09명이 보호출산을 했다. 보호출산을 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17곳의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심층상담을 하고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상담은 보호출산뿐 아니라 경제적·법률적 고민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지는데 심층상담자 340명 중 30% 이상이 보호출산을 택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후 아동 유기도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기 아동은 30명으로 전년(88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위기영아 보호시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도 2021년 113명, 2022년 106명, 2023년 79명에서 지난해 33명, 올해 현재 16명으로 급감했다. 이 중 일부는 보호출산을 안내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 임신부들도 제도권에 들어온 셈이다.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 주사랑공동체는 보호출산제 도입 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건의 보호출산을 연계했다. 주사랑공동체 제공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양육할 마음을 다시 가진 이들도 적잖았다. 171명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는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여성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은 1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명은 철회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숙영 애란원 원장은 "대부분 보호출산을 할 수 있다 등 단편적 정보만 알고 오는데, 상담 과정에서 몰랐던 복지 제도를 알게 돼 (양육할) 용기를 얻는 엄마도 있다"고 전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해 올해 3월 아이를 낳은 김희진(가명·18)씨가 이런 경우다. 그는 보호출산 후 위탁 시설에 아이를 보냈다가 4일 만에 도로 데리고 왔다. 막상 보내고 나니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방긋방긋 웃던 아기의 얼굴과 내미는 손, 배냇짓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아기 생각이 계속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보호출산제는 사회 안전망이자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위기 임산부 지원기관이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원가정 양육이다. 이 원장 역시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고, 보호출산은 마지막 선택"이라고 짚었다. 김씨 역시 보호출산제에 대해 "어려운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기를 양육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숙려 기간 동안 정이 들어 아기를 보내기도 힘들고,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을 알게 돼서 용기 낼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명 입양 등 여러 선택지를 알게 되면서 선택을 바꾸기도 한다. 보호출산 문턱까지 갔던 이희경(가명·26)씨는 고민 끝에 실명 입양을 택했다. 그는 "잘 키우지 못하고, 아이에게 짜증을 많이 낼 것 같았다"며 "아이가 더 좋은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입양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이가 나중에 저를 찾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가 아직 있긴 하다. 미등록 외국인은 자녀를 낳아도 출생등록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를 모르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여전히 민간 시설인 베이비박스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황민숙 베이비박스 센터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온 베이비박스 센터 운영에 국가도 동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출처:한국일보
원본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813490005376?di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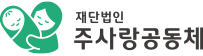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